버퍼드 캐피털이 9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들이 특허를 보유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지적 재산권(IP) 보유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부터 사업 협상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목적이 무엇이든, 특허를 현금화함으로써 재정적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광고_1]
 |
| 한국기업의 억만장자 돈벌이 수단. (출처: 메종오피스) |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법률 금융 회사인 버퍼드 캐피털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대기업들은 특허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IP)을 수익화하기 위해 여러 건의 주목할 만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Burford Capital의 전무이사인 캐서린 울라니크와 회사 특허 그룹의 법률 위험 평가 및 인수 책임자인 크리스 프리먼은 2024년 초만 해도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정교한 IP 소유자와 관련된 상당한 특허 거래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올해 반도체 대기업은 한국 특허 통합 사이트인 아이디어허브의 자회사에 1,500건이 넘는 특허를 매각했습니다.
LG전자는 2023년 11월 코덱 기술과 관련된 표준필수특허 48건을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에 매각했습니다. 이 회사는 2021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하면 이러한 특허 중 일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번 매각은 Oppo와 Vivo 등 다른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특허 결함으로 소송을 겪고 있는 가운데, LG가 보유한 약 24,000개의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 특히 4G, 5G 및 Wi-Fi 기술 분야의 특허를 활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LG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회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분야인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특허 라이선싱 그룹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또한 IP 분야의 핵심 기업으로 떠올랐으며,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통신, 가전제품, 반도체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2023년 삼성은 여러 건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즉각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다른 기술 대기업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삼성이 수익성과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강력한 IP 관리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기업이 특허를 귀중한 재정적 자산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수익화 결정의 이유는 기업마다 다르다고 밝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IP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는 수백만 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으며, 관련 특허 자산을 취득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상당한 법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회사는 합법적 자산에서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감소하는 매출이나 줄어드는 이익 마진을 보완하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잘 확립된 회사나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서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이러한 이유가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LG전자와 같은 회사가 사업에서 손을 떼고 더 이상 운영의 핵심이 아닌 IP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P는 또한 사업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등 기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은 자본 관리에 신중해야 하며, 가치 추구에 있어 창의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많은 특허 소유자들에게 기업 분할은 최적의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고 운영 부담도 최소화하면서 기업들은 지식 재산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광고_2]
출처: https://baoquocte.vn/phat-hien-kenh-kiem-tien-bac-ty-cua-cac-cong-ty-han-quoc-287708.html




![[사진] 난관을 극복하고 화빈 수력발전소 확장사업 공사 진행 속도 높여](https://vstatic.vietnam.vn/vietnam/resource/IMAGE/2025/4/12/bff04b551e98484c84d74c8faa3526e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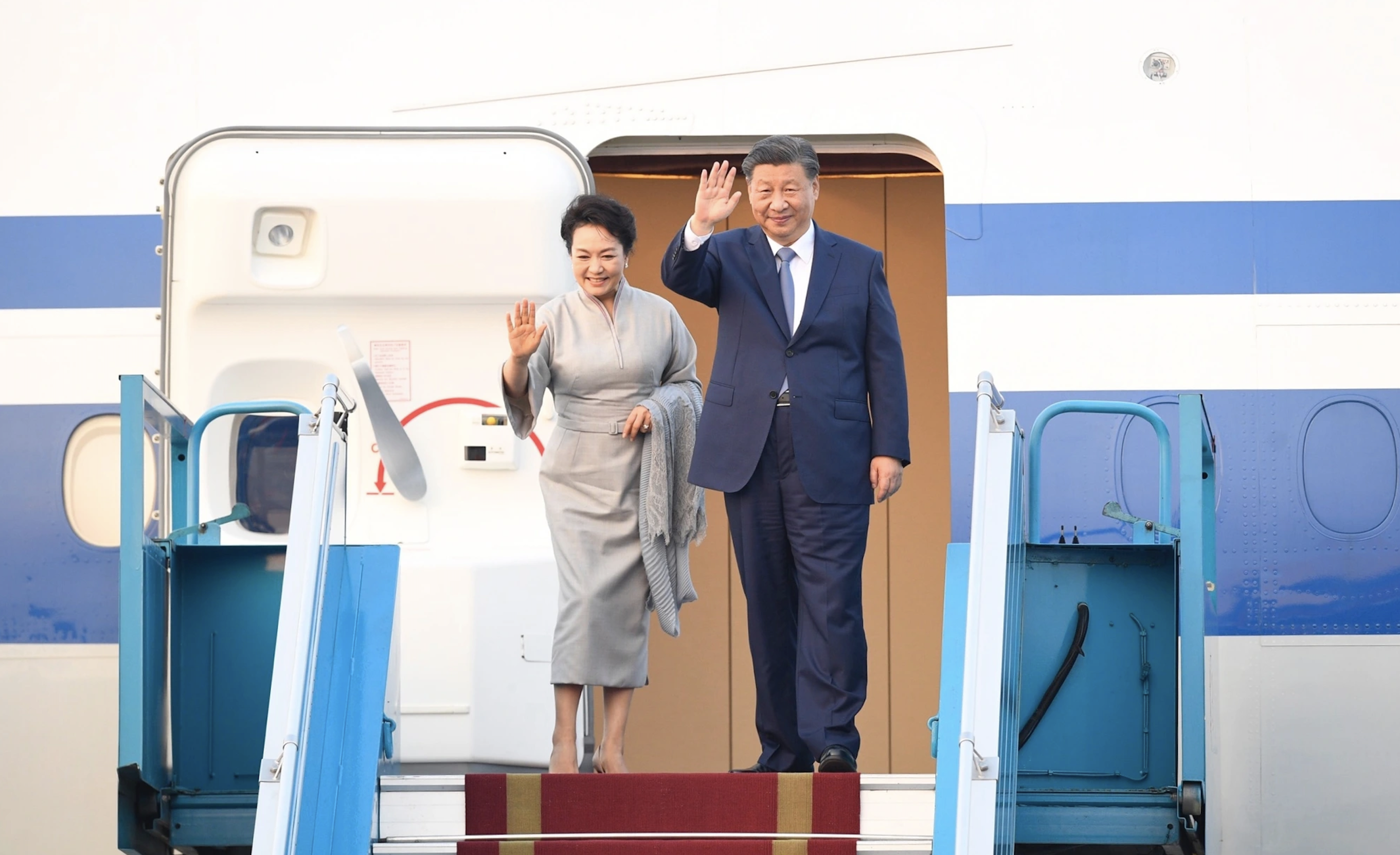

![[사진] 베트남 공산당 제13기 중앙위원회 제11차 회의 폐막](https://vstatic.vietnam.vn/vietnam/resource/IMAGE/2025/4/12/114b57fe6e9b4814a5ddfacf6dfe5b7f)






![[사진] 팜민친 총리, 한국 기업인들과 대화](https://vstatic.vietnam.vn/vietnam/resource/IMAGE/2025/3/4/396bd484e3dc468d921840959fd9973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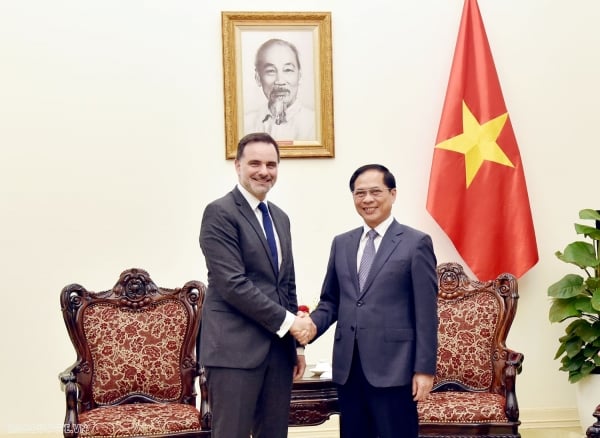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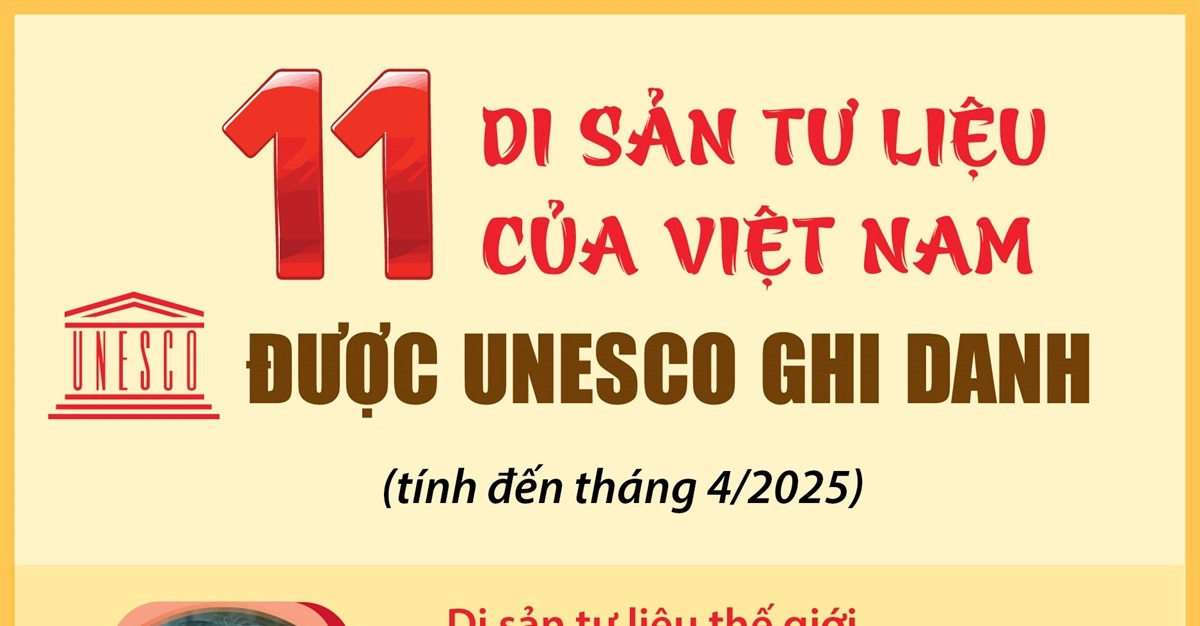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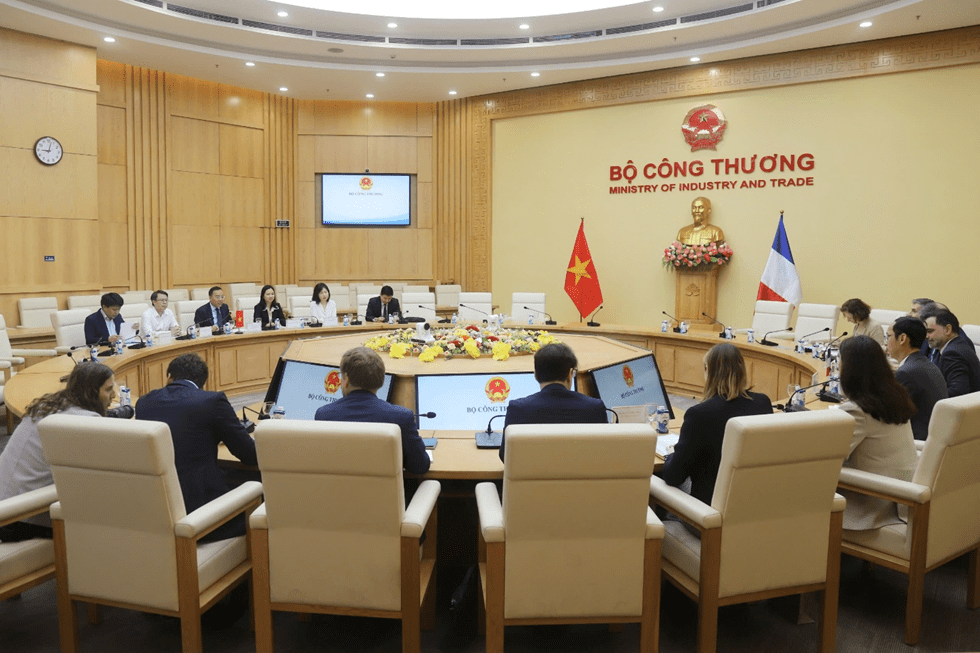



























댓글 (0)